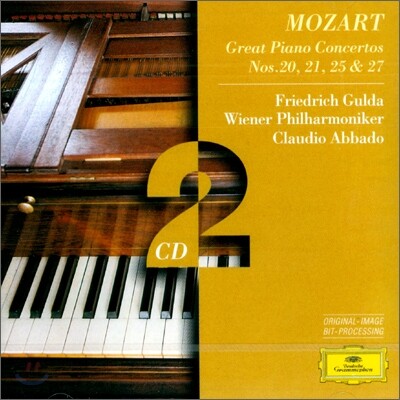![]() http://ch.yes24.com/Article/View/21126
http://ch.yes24.com/Article/View/21126
지난 회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들었습니다. 내친 김에 그 다음 곡인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K.467>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물론 그 유명세는 영화 <엘비라 마디간>(1967) 덕택이지요. 이 영화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세계적인 히트곡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미국의 빌보드 톱10에까지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엘비라 마디간>은 1960년대에 제작된 영화 중 보기 드물게도 인상파적 영상미를 제법 연출해냈던 영화인데, 그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협주곡 21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악장으로 손꼽히는 2악장 안단테가 곳곳에서 흘러나옵니다. 덕분에 협주곡 21번의 ‘별칭’이 바뀌는 일까지 생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 이 협주곡의 별칭이었던 ‘군대’가 ‘엘비라 마디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물론 ‘군대’라는 별칭도 모차르트가 붙인 건 아니었지요. 행진곡풍으로 당당하게 시작하는 1악장 때문에 후대 사람들로부터 얻은 닉네임이었습니다. 어쨌든 영화 <엘비라 마디간>이 세계적 히트를 기록한 다음부터, 이 협주곡은 그냥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이름으로 통하게 됩니다. 음반가게에 가서 “엘비라 마디간 주세요” 하면, 협주곡 21번을 곧바로 꺼내줬을 정도입니다.

2악장 선율이 사용된 [엘비라 마디간]의 한 장면 <출처: 네이버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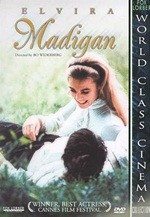 |
 |
20~30대는 이 영화를 잘 모를 듯합니다. 제가 7년 전쯤에 썼던 에세이에 이 영화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이곳에 잠시 옮겨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에 총구를 겨눕니다. 하지만 차마 쏘지 못하지요. 그때 어디선가 나비 한마리가 나풀나풀 날아옵니다. 그녀는 나비처럼 가벼운 몸짓으로, 그 나비를 쫓아가지요. 그녀가 나비를 마악 손에 잡으려는 순간 화면은 멈춥니다. 이윽고 들려오는 두 발의 총성. 아름다운 초원에서, 인상파 그림 같은 햇살을 역광으로 받으면서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죽어갑니다. 참으로 지독한 낭만주의였지요. 1967년도 스웨덴 영화 <엘비라 마디간>입니다. 엘비라는 서커스단에서 줄을 타는 소녀였습니다. 육군 중위 식스텐과 사랑에 빠지지요. 전쟁을 혐오하는 식스텐은 아내와 두 아이를 버리고 엘비라와 함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도피행각을 쫓아가지요. 그 도피는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합니다. 두 사람은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수시로 세어보고, 허기에 지친 엘비라는 토끼풀을 뜯어 먹기도 하지요. 국내 모기업의 CF에 등장했던 유명한 장면, 서로 다투던 남녀가 ‘미안하다’는 쪽지를 적어 시냇물 아래로 흘려보내던 모습도 바로 이 영화의 한 장면이었지요.”
지금 읽어보니 약간 민망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것과 더불어, 당시 17살에 불과했던 발레리나 출신의 여배우 피아 데게르마르크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어 버립니다. 청순하기 이를 데 없는 외모의 그녀는 1967년도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지요. 하지만 그 후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채 곧바로 대중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맙니다.
모차르트가 협주곡 21번을 작곡한 해는 빈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10년’의 딱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785년입니다. 이 해에 모차르트는 3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잇달아 써냅니다. 20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특히 21번은 20번을 작곡하고 난 후 불과 한 달도 안돼 세상에 첫선을 보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걸작을 써냈던 것에 대해, 후대의 음악사가들은 대개 모차르트의 ‘천재성’이라는 맥락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매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모차르트에게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두 개의 수입원은 피아노 레슨과 연주회였고, 그중에서도 연주회는 항상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여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숙제였을 겁니다. 물론 그 연주회들은 모두 ‘예약’ 연주회였습니다. 올 손님들이 이미 정해진 연주회였다는 뜻이지요. 그들은 주로 귀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이었는데, 모차르트의 연주회에 단골로 찾아오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차르트는 지난번에 했던 곡을 다시 반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연주했던 곡과 새로 선보일 곡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손님이 이번에도 또 오셨는데, 분위기기 비슷한 곡을 잇따라 연주하면 손님들이 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뭔가 색다른 음식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모차르트가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20번에 이어 21번을 듣는 ‘핵심적 매뉴얼’이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d단조(단조는 소문자로 씁니다)의 조성을 지닌 20번과 C장조(장조는 대문자로 씁니다)의 조성을 가진 21번은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라는 뜻입니다. 20번이 전반적으로 어둡고 격정적인데 비해, 21번은 맑고 밝아서 개구쟁이 같은 느낌마저 풍기는 곡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차르트가 대책 없이 개구쟁이 짓을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밝음의 정조(情操)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음악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느린 2악장에서 보여주는 슬픔도 결코 신파로 빠지지 않으면서 애잔한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협주곡 21번은 그렇게 ‘웃음과 슬픔의 2중주’라는 모차르트 음악의 요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악장은 ‘군대’라는 별칭의 이유가 됐을 만큼 행진곡풍으로 당당하게 문을 엽니다. C장조의 으뜸화음으로 제시되는 주제부를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계이름으로 ‘도솔도미 파미레도시’입니다. 관현악 총주가 그 주제부를 여러 차례 반복한 다음, 피아노가 산뜻하게 등장합니다. 기교적으로도 현란합니다. 한데 잠시 후에 피아노 독주가 어두운 단조의 선율을 아주 잠깐 연주합니다. 바로 그 지점, 피아노가 갑자기 선율적으로 어두워지는 부분도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우울한 정조는 금세 사라지고 다시 장조의 밝은 색채로 돌아옵니다. 피아노가 보여주는 이런 색채감, 아울러 피아노와 관현악 파트가 주제 선율을 서로 주고받는 장면들에 집중하면서 1악장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악장은 그 유명한 안단테입니다.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이름을 얻게 만든 악장이지요. 현악기들이 잔잔한 물결 같은 주제 선율을 노래하고 피아노가 이어받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들어도 귀에 쏙 들어오는 아름다운 악장입니다. 마지막 3악장은 약간 수다스러운 느낌으로 시작하지요. 현악기들이 짧은 음형을 새가 지저귀듯이 노래하고 관악기들이 거기에 가세하면서 음량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아노가 등장하지요. 역시 약간은 수다스러운 느낌으로 피아노가 달려 나가고 관현악이 리드미컬하게 조응합니다. 그렇게 피아노와 관현악이 대화를 주고받다가 매우 화려하고 강력한 느낌으로 곡을 마무리하지요. 3악장은 전체 악장들 가운데 가장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1악장은 행진곡풍의 당당함, 2악장은 애틋한 슬픔, 3악장은 경쾌하면서도 약간 수다스러운 대화라고 할 수 있지요. 좀 기계적인 도식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새겨두는 것도 음악 듣기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문학수
▶ 게자 안다(Geza Anda),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1961년/DG
▶ 프리드리히 굴다(Friedrich Gulda), 클라우디오 아바도ㆍ빈 필하모닉/1974년/DG
▶ 머레이 페라이어(Murray Perahia),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1976~1984년/Sony
|
||||||||
'내 인생의 클래식 101'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op.67 (0) | 2013.02.05 |
|---|---|
| 하이든, 현악4중주 제77번 C장조 op.76-3 ‘황제’ (0) | 2013.02.01 |
|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K.466 (0) | 2013.01.30 |
| 비발디, 협주곡 <사계 op.8 1~4> (0) | 2013.01.30 |
|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 B플랫장조 D.960 (0) | 2013.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