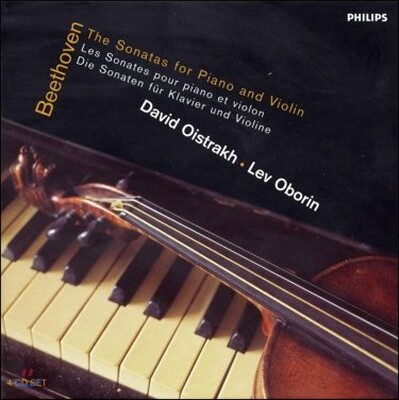남녘에서부터 봄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주말 뉴스는 섬진강가의 만개한 산수유꽃을 보여주더군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Op.24>는 지금 듣기에 딱인 음악입니다. ‘봄’이라는 이름을 베토벤이 직접 붙인 것은 아니지만, 음악의 분위기에 참으로 잘 들어맞는 별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봄’을 표상하는 음악은 이밖에도 많지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내 인생의 클래식 101’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었던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는 당연히 봄으로 막을 올립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에도 봄기운이 샘솟고, 멘델스존의 <무언가>에도 ‘봄의 노래’가 들어 있지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종달새’도 봄 냄새가 물씬합니다. 드뷔시가 색채감 있는 관현악으로 그려낸 ‘봄’도 있습니다. 또 슈만의 교향곡 1번도 ‘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데 잠시 언급하자면, 슈만의 ‘봄’은 어딘지 모르게 우울하고 불길합니다. 아마 슈만의 기질 탓일 겁니다. 교향곡 1번을 작곡하는 동안에도 슈만은 조증과 울증을 여러 번 반복했을 테고 그것이 그대로 음악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해 전 쓴 글에서 슈만의 교향곡 1번을 ‘춘래불사춘의 음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봄이 와도 온 것 같지가 않다’는 뜻이지요.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시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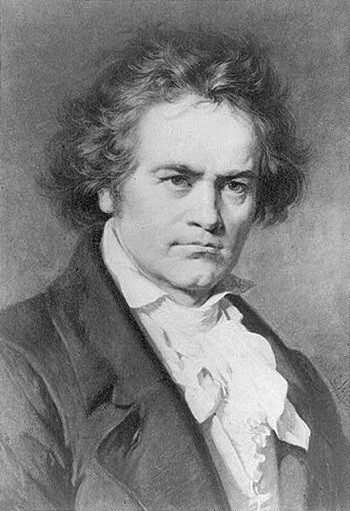
루드비히 반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출처: 위키피디아]
베토벤은 모두 10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5번 ‘봄’은 9번 ‘크로이처’와 더불어 가장 사랑받는 곡이지요. 다시 말하거니와 따사로운 봄의 정취에 이만큼 잘 어울리는 음악도 찾기 힘듭니다. 작곡 시기는 1801년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잠시 베토벤의 생애를 복기해 보겠습니다. 자, 베토벤이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를 썼던 것이 1802년이었지요? 지난해 11월 15일자 <내 인생의 클래식 101>, 그러니까 교향곡 3번 ‘에로이카’를 거론할 때 이 유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죽지 않았지요. 대신 ‘걸작의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이른바 베토벤의 ‘음악적 중기(中期)’로 일컬어지는 시대가 열립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베토벤을 연상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드라마로서의 음악’이 이 시기에 발화합니다. 또한, 앞 시대의 선배인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어법을 점점 강화해갔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지요.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Op.24>는 이른바 ‘중기’로 들어서기 직전에 썼던 음악입니다. <소나타 4번 a샤프단조>와 <소나타 5번 F장조>를 거의 동시에 작곡했지요. 하지만 곡의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4번은 어둡고 내향적인 반면에 5번은 밝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제목이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립니다. 이 시기의 베토벤, 그러니까 의사들로부터 “당신의 난청(難聽)은 치유불능입니다”라는 판정을 받기 전의 베토벤은 아직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소나타 5번 ‘봄’은 고전주의 음악에서 주로 표현했던 ‘양식화되고 객관화된 감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적 이디엄으로 기억하고 있는, 드라마틱하고 주관적인 감정 표현은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베토벤적 개성이 서서히 꿈틀거림을 감지할 수 있지요. 앞서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1ㆍ2ㆍ3번이 모차르트의 영향을 짙게 드러내고 있는 것에 견주자면, 4번과 5번은 그 영향권에서 꽤 벗어나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5번 ‘봄’에는 모차르트적 기풍과 베토벤적 개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봄’은 듣기에 편안하고 아름답다는 측면(고전적 기품)과 더불어, 베토벤 특유의 변화무쌍함, 듣는 이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출렁거리는 음악적 쾌감’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를 통해서 보다 낭만적으로 확장된 드라마를 맛보려면 좀더 기다려야 하겠지요. 그것은 적어도 하일리겐슈타트의 유서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토벤의 ‘봄’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봉두난발에 광기어린 눈빛으로 표상되는 베토벤이 이렇게 달콤하고 따사로운 곡도 썼다는 사실입니다. 바이올린으로 문을 여는 1악장의 첫번째 주제는 매우 청명하고 상쾌합니다. ‘정말 베토벤의 음악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달콤한 선율이지요. 피아노는 밑에서 바이올린을 조용히 받쳐주다가 잠시 후 위로 도약합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위치를 바꿔가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주가 펼쳐지지요. 얼었던 시냇물이 풀려 졸졸 흘러가는 느낌, 들판의 나무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듯한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면서 베토벤적 개성을 드러내지요.
이어서 느리게 흘러가는 2악장은 피아노가 먼저 문을 엽니다. 바이올린이 그 위에 살며시 얹히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2중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위치를 바꾸지요. 바이올린이 노래하고 피아노가 밑에서 반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주고받는 대화에 집중하면서 2악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노래하면 한쪽이 슬쩍 뒤로 물러서고, 그러다가 다시 위치를 바꾸는 장면을 반복하지요. 봄날의 아지랑이를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억’이나 ‘회상’ 같은 단어를 연상하게 만들지요. 저는 이 곡의 2악장을 들을 때마다, 헤어졌던 친구나 연인이 노년에 이르러 재회하는 장면, 산등성이에 나란히 앉아 ‘옛날’을 회상하는 장면을 연상하곤 합니다.
3악장은 빠른 템포의 스케르초 악장이지요. 피아노가 경쾌한 8마디를 연주하면서 시작합니다. 곧이어 바이올린이 합세하지요. 이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이, 피아노가 깡총깡총 달려가고 바이올린이 그 뒤를 깔깔대며 쫓아가는 분위기의 연주가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스케르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익살스러운 악장입니다.
1분이 조금 넘는 짧은 스케르초가 끝나고 이어지는 4악장은 같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론도(Rondo) 악장이지요. 피아노가 먼저, 이어서 바이올린이 첫 주제를 연주합니다. 이 주제는 4악장에서 네 차례 반복됩니다. 물론 단조의 두번째 주제, 당김음을 사용하는 세번째 주제도 등장하지만, 가장 많이 반복되는 첫번째 주제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지막 악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봄’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랑받는 9번 ‘크로이처’는 다음 기회에 같이 듣도록 하지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면서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글/문학수
'내 인생의 클래식 101'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Op.47 ‘크로이처’(Kreutzer) (0) | 2013.04.29 |
|---|---|
|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Pictures at an Exhibition) (0) | 2013.04.29 |
| 하이든, 현악4중주 78번 B플랫장조 Op.76-4 '일출' (0) | 2013.04.23 |
| 슈만,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48) (0) | 2013.04.01 |
|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Clair de Lune) (0) | 2013.04.01 |